 편집국
편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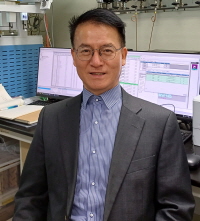
최영남(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국장)
【에코저널=서울】대동강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물을 길어가는데 돈을 챙긴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민화로 전해져 온다. 공유재화인 물을 사 먹는 것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물을 사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여행, 운동 등 활동 시에는 필수가 됐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생수를 먹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홀로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수의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왔다. 만년설이 덮인 고지대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접하고,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오래된 역사가 깃든 고대 도시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반면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회이기도 했다.

▲알프스 빙하 중 가장 웅장한 규모의 ‘알레치 빙하(Aletschgletscher). 지구온난화로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 스위스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알프스 계곡은 만년설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며, 상상했던 것과 달리 계곡에는 흐르는 물이 훨씬 적었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고 땅이 점차 드러나면서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국경선 설정을 협상해야 한다고도 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위스나 이탈리아도 500mL 1병에 2~3유로(1400원/유로) 정도 가격을 주고 생수를 사 먹어야 한다. 호텔과 호텔 내 식당, 음식점 등에서 물을 공짜로 주는 곳은 없다. 호텔이나 음식점에 가더라도 물을 마음껏 부담 없이 먹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물은 필수적인 소비재로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품질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인식이 갈수록 형성되고 있어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최근에 이런 물값이 휘발유값 보다 비싸졌다. 페트값 등 원·부자재 및 물류비의 상승 등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 체르마트(Zermatt) 마테호른(Matterhorn).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수의 가격은 용량별, 판매처별로 다르게 형성되는데,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이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편의점에 유통되는 생수(500㎖) 6종류를 분석한 결과, 생수 가격은 700원에서 2200원대 사이에 형성됐고, 평균 1125원꼴이었다.
가장 비싼 제품은 수입 제품인 ‘에비앙’(2200원)이었고, GS와 CU의 PB(Private Brand) 상품인 ‘지리산맑은샘물’과 ‘HEYROO미네랄워터’는 각각 7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국내 생수 시장 점유율 1·2위인 광동제약의 ‘제주삼다수’와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는 각각 1100원이었다.
이를 같은 날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게재된 휘발유의 ℓ당 평균 가격(약 1602원)과 같은 단위로 환산해 비교할 시 ‘기름값’(160.2원/100mL)보다 ‘물값’(225원/100mL)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값, 채소값 등 다른 물품의 가격이 오르면 언론매체 등에서 나리가 나는데 물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는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무의식중에 물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나를 물로 보는냐”, “물먹었다”, “물수능” 등 물을 경시하는 정서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곳곳이 장마와 가뭄 그리고 폭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열대화란 표현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말한다. 물을 잘 관리하고 이용하는 국가가 미래에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함에도 4대강 사업 추진을 기점으로 진영 간 이념화되어버린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애꿎은 공무원들만 잡는다. 그러니 공직에 회의를 느끼고 떠나거나, 떠나고 싶은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과학적인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의 물 문제를 고민하고 적합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가올 물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때 우리의 미래가 정말 보장되기 때문이다.